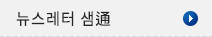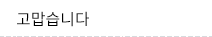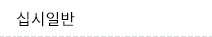의사가 쓰는 수필 : 어머니 마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생명사랑기금 작성일21-05-18 16:37 조회2,8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번만 먹어보자
“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잉잉~”
어렸을 적에 나는 이불을 푹 뒤집어쓴 채 더는 간섭하지 말라는 듯이 벽을 향해 홱 돌아누우며 서럽게 외쳤다.
“이거 먹어야 열이 떨어져. 이렇게 이마가 불덩이 같은데…. 제발 부탁이니 한 번만 먹자 응?”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던 어머니의 간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양보할 기미를 전혀 없었다.
“그게 내 배 속에 들어오면 녹아서 확 퍼진다고 했단 말이야. 난 절대로 안 먹는다니까.”
며칠 전 나는 텔레비전에서 동그란 알약이 위장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퍼져 위벽 전체를 감싸는 신기한 광고를 보았었다. 이런 장면이 호기심 많던 나의 뇌리에 단단히 새겨졌으니 어머니가 내미시는 동전만한 알약이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달갑지 않을 만도 하였다. 변변한 약국 하나 없던 시절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급하게 구해온 해열제를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애를 쓰셨건만 엉뚱한 고집을 내세우며 버티던 아이 앞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 까웠겠는가?
환자로 만난 승연 씨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봉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승연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몇 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는데 최근 폐로 전이가 되었다고 한다. 요즘 들어 숨찬 증상이 부쩍 심해져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였다. 오랜만이라 반갑게 전화를 받았건만 그녀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라 하니 마음이 씁쓸할 수밖에 없었다. 병실에 입원한 그녀는 죽음에 맞닥뜨려 주눅이 들어 우울할 것 같았지만 의아하게도 표정이 생기발랄했다. 수술 후 유방암 3기로 확진되었지만,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 다고 하길래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수술할 당시 그녀는 복잡한 채무 관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기는 했지만, 몸도 마음도 다 만신창이가 되어 그런 치료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 같은 병실에 있었던 다른 세 명의 유방암 환자들은 병원에서 권한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모두 천국에 가고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간 아무 치료를 받지 않았어도 잘 살아오기만 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신념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는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곤 하였다.
그녀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여 갔다. 숨이 차오르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그녀는 피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야만 했다. 주치의 로서 그녀를 돌보는 내가 더 불안해져서 어떤 것이 라도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요지부동 이었다.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건만
그때의 나처럼 부정확한 정보나 그릇되어 보이는 결정을 고수하며 반드시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치료를 원치 않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가 보편화 되었고, 로봇 수술을 비롯한 각종 첨단 암 치료법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나큰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검증된 좋은 치료법들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는 환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들을 몰아세우거나, 심하게는 치료를 받지 않으 려면 다시는 자신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윽박지르 기도 한다.
승연 씨는 나를 주치의로서 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로서 많이 신뢰하였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치료를 받으라는 권고에 대해서만은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하였다. 내가 그녀를 가장 잘 도울 방법 이라고 생각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녀를 괴롭 히는 일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느 순간 부터는 나도 단념하고 그런 치료를 더는 권하지 않게 되었다.
들꽃 같은 해맑음으로
끝까지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숨이 너무 차서 자리에 눕지도 못한 채 앉아서 밤낮을 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잠들기 직전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물어 가는 저녁 햇살에 하늘거리는 들꽃이 방긋거리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듯이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 다는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암 환자를 돌보아왔지만 이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생의 마지막 문턱을 의연하게 넘는 모습을 이전에는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병세는 눈에 띌 정도로 악화하여 갔지만, 그녀의 정신은 더 맑아져 퐁퐁 솟는 샘물과 같았다. 숨이 차서 짧게 짧게 끊어서 힘겹게 던지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 남기는 소중한 보화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끝까지 저를 존중해주시고….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표준 암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남은 생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도리어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 일로 질병을 치료하여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치료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환자를 돕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환자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더 해줄 것이 없어 다만 이런 광경을 지켜봐야만 하는 마음의 아픔조차도 이겨내야 한다. 때로는 ‘제발 한 번만 먹어줘!’라는 애원을 잠깐 멈추고 아픈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환자 내면의 깊은 곳을 살펴봐야 할 때도 있어야 한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결정을 전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료인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G샘병원 외과 이채영 샘통암병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